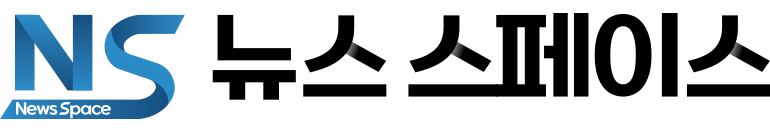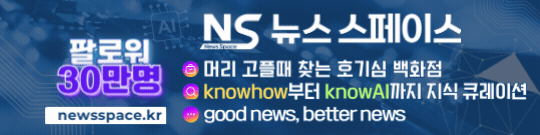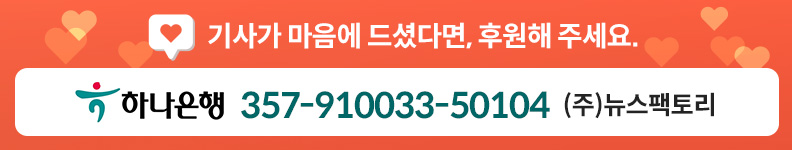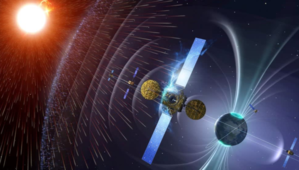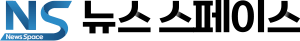[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천문학계가 외계 생명체 탐사를 둘러싼 ‘전환기’에 진입했다는 평가 속에, 외계행성 대기에서 해양 위성까지 아우르는 다중 전선 탐사가 동시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NASA가 1월 11일(현지시간 10일 밤 기준) 캘리포니아 밴든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쏘아올릴 소형 위성 ‘판도라(Pandora)’는 이런 흐름을 반영한 2000만 달러(약 260억원)짜리 실험실로, 향후 1년간 20개 안팎의 외계행성 대기를 연속 관측해 수증기와 잠재적 생명신호(바이오시그니처)를 추적한다.
판도라, “행성과 항성을 분리하라”
판도라는 NASA 천체물리학 ‘파이오니어스(Pioneers)’ 프로그램의 첫 임무로, 큐브샛보다 큰 ‘스몰 새틀라이트’급 소형 위성에 가시광선·근적외선 관측 장비를 실어 모항성(母恒星)의 요동치는 빛과 행성 대기 신호를 분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엘리사 퀸타나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수석 연구원은 “판도라의 목표는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을 활용해 행성과 항성의 대기 신호를 정교하게 분리하는 것”이라며 “각 목표를 최소 10회, 경우에 따라 24시간 연속으로 들여다보며 항성 표면의 플레어·흑점 변동이 스펙트럼에 끼치는 영향을 모델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성 활동에 의한 ‘가짜 생명신호’와 진짜 신호 구분을 위한 통계·모델링 기법 시험대
판도라가 노리는 것은 ‘첫 발견’의 화려한 헤드라인보다, 향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과 유럽우주국(ESA) PLATO, NASA 낸시 그레이스 로만망원경으로 이어지는 대형 미션의 데이터 해석 방식을 표준화하는 실험실에 가깝다는 평가다.
18광년 밖 ‘슈퍼지구’, 20년 데이터로 건져 올리다
외계 생명체 탐사의 또 다른 축은 “직접 가보긴 멀지만, 대기 스펙트럼은 따낼 수 있는” 근거리 슈퍼지구 후보 발굴이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펜스테이트)를 포함한 국제 연구팀은 2025년 10월, 지구에서 불과 18광년 떨어진 적색왜성 GJ 251을 도는 슈퍼지구 ‘GJ 251 c’를 발표했다.
HPF는 10m급 허비 탤레스코프인 ‘하비-에벌리 망원경’(HET)에 탑재된 근적외선 분광기로, 온도 3,000~4,000K대의 차가운 적색왜성 주변에서 지구 질량 수배 수준 행성이 별을 얼마나 ‘당기고 미는지’를 정밀 측정해 존재를 간접 추정한다. NEID 역시 미터/초 단위의 시선속도 변화를 가려내도록 설계돼, 두 장비의 장기 데이터를 합쳐서야 GJ 251 c라는 신호가 통계적 유의수준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수브라스 마하데반 펜스테이트 연구원은 “GJ 251 c는 향후 5~10년 안에 외계 생명체의 대기 신호를 겨냥한 연구에서 최고의 표적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며, “현재 궤도 기하학상 통과(transit)는 보이지 않지만, 2030년대 30미터망원경(TMT) 같은 초거대 지상망원경의 직접 이미징과 분광이 가능해지면 대기의 조성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이메틸 설파이드 충격’ 이후… 통계 함정과 해명 시도
외계행성 대기에서 생명신호를 찾는 방식은 지금 가장 첨단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회의와 반론이 쏟아지는 분야다. 2025년 4월, 일부 연구팀이 JWST 관측 데이터에서 외계행성 K2-18 b 대기 속 ‘다이메틸 설파이드(DMS)’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 이는 지구에서 주로 해양 플랑크톤 등 생물학적 과정으로 생성되는 분자라는 점 때문에 “첫 잠정적 생명신호 후보”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2026년 1월 재분석에서는 90개가 넘는 대체 분자 조합 모델이 같은 데이터에 동등하거나 더 나은 적합도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분석을 이끈 벤자민 슈미트 연구팀은 “스펙트럼이 워낙 노이즈가 많은 탓에, 보고된 특정 흡수 특징이 통계적 요동인지 실제 분자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단일 모델만 골라내 성공 사례로 포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통계적 함정’”이라고 지적했다.
네스토르 에스피노사 천문학자는 “JWST 이전에는 이런 고차원(고파라미터) 대기 모델을 실제 관측으로 검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모델 수가 너무 많아져 어떤 조합이 진짜인지 판단하는 통계 기준을 더 엄격히 세워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 논쟁은 향후 ‘생명 신호 발표’가 나오더라도 최소 두 대 이상의 망원경, 서로 다른 파장대 관측, 독립 연구팀의 교차 검증이 동시 충족돼야 과학계가 수용할 것이라는 공감대를 강화했다.
유로파 클리퍼·해양세계 프로젝트, “얼음 밑을 보라”
‘하늘의 행성’만큼이나 중요한 외계생명 후보지는 태양계 안쪽, 얼음 밑 바다를 품은 이른바 ‘해양세계(ocean worlds)’다. NASA의 목성 위성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Europa Clipper)’는 2024년 10월 플로리다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 팰컨 헤비에 실려 발사됐으며, 약 29억km(18억마일)를 비행해 2030년 목성 궤도에 도착할 예정이다.
지하 바다가 현재 ‘거주가능(habitable)’ 환경인지 여부 평가
유로파 클리퍼의 관측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지 미리 대비하는 프로젝트가 2026년 가동되는 NASA 지원 ‘해양 세계 조사(Investigating Ocean Worlds·InvOW)’다. 우즈홀해양연구소(WHOI), MIT, UC샌타크루즈 등 미국 내 16개 연구실이 참가하는 이 5년짜리 다학제 프로그램은, 해저 암석권–심해–얼음 껍질을 잇는 세 영역에서 유기탄소가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실험·모델링·현장 조사로 동시에 추적한다.
크리스 저먼 WHOI 수석연구원은 “해양세계에 실제 생명체가 있다 해도, 그 유기 분자 신호는 바닥의 암석권에서 생성되어 바다를 거쳐 얼음 껍질로 이동하는 동안 수차례 물리·화학적 가공을 거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신호가 어떻게 희석·왜곡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우주선이 수집한 데이터만 보고 ‘있다/없다’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LATO·로만망원경·차세대 망원경, “10년 뒤 직접 찍는다”
지금은 간접 신호 싸움이지만, 10년 뒤에는 지구 닮은 행성을 ‘직접 찍고, 대기를 분광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 천문학계의 중장기 로드맵이다.
ESA의 ‘PLATO(PLAnetary Transits and Oscillations of stars)’ 우주망원경은 2026년 12월 유럽 신형 발사체 아리안 6호에 실려 태양-지구 L2 지점(지구에서 약 150만km)에 배치될 예정으로, 26대 카메라로 최대 20만 개 별을 장기 모니터링하며 지구형 행성의 통과를 포착한다.
PLATO의 목표는 단순한 ‘행성 찾기’를 넘어, 항성의 미세한 진동을 분석하는 성진동학(asteroseismology) 기법을 통해 행성과 항성의 질량·반지름·나이를 동시에 정밀 측정해 ‘또 다른 태양-지구 쌍’을 통계적으로 정의하는 데 있다.
뒤이어 2029년 발사가 예정된 NASA의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은 차세대 코로나그래프 기술을 투입해, 별빛을 인공적으로 가려 주변 행성을 직접 분리해 찍는 직영상(direct imaging) 시대를 여는 시험대다. 지상에서는 하와이·칠레 등에 건설 중인 30m급 초대형망원경(TMT·E-ELT 등)이 2030년대 중반부터 근거리 슈퍼지구·미니네ptune급 행성 대기를 고해상도로 분광해, GJ 251 c와 같은 표적의 실제 대기 조성을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연구자들은 내다본다.
네스토르 에스피노사는 “궁극적으로 외계 생명체 존재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려면, 통과 스펙트럼·직접 이미징·열적 방출 분석 등 서로 다른 기법에서 같은 행성, 같은 분자 신호가 반복 확인돼야 한다”며 “그 과학적 기준을 만족하는 첫 사례가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추가 관측과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존재하지 않는다”는 단정 대신, 통계적 함정을 피해가며 ‘가능성이 높은 행성·위성 후보를 얼마나 촘촘하게 좁혀 갈 수 있느냐’가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판도라의 소형 실험부터 유로파 클리퍼, PLATO, 로만망원경, 그리고 30m급 초대형망원경까지 이어지는 다층적 장기 프로젝트는, 그 10년 승부의 결과에 따라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