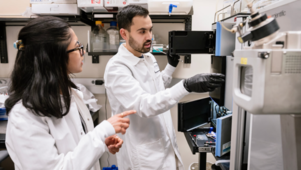[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편집자주> 유튜브, 인스타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받지 않았다', '광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는 뜻의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생겼다. 비슷한 말로 "내가 궁금해서 결국 내가 정리했다"는 의미의 '내궁내정'이라고 이 기획코너를 명명한다. 우리 일상속에서 자주 접하는 소소한 얘기거리, 궁금증, 호기심, 용어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인간의 몸은 그 자체가 하나의 경이로운 우주다. 국내외 최신 논문과 매체, 그리고 SNS와 대중문화의 시각을 아우른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신체의 다양한 부분이 어떻게 기능하고 무너질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는지, 철학적·문화적 맥락에서 탐구한다.
'면도칼도 녹이는 위산에 녹지 않는 위'의 비밀: 3~4일마다 점막을 바꾸는 셀프 방어시스템
위산은 면도칼도 녹일 정도로 강하다. 하지만 스스로를 녹이지 않으려고 위벽은 스스로 자가복구 시스템을 가동해 3~4일마다 전체 상피세포를 교체하며, 강력한 위산에 녹아내리지 않도록 한다. 위 내벽은 1분마다 50만개의 세포가 제거되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 현상은 생명유지엔 필수적인 ‘자가 방어’ 전략임을 보여주며, 동양과 서양의 철학적 관점 모두에서 ‘변화’와 ‘회복’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심장은 '30억번의 맥박'으로 완주한다
평균적으로 심장은 일평생 30억번 이상 뛴다. 하루 약 10만번,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펌프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 정상인의 안정시 심박수는 분당 60~100회이며, 심박수가 빠를수록 수명 단축 위험도 높아진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학계에 발표됐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명은 최초의 심장박동으로 시작되고, 마지막 박동과 함께 끝난다”고 말한 바처럼, 심장은 생명의 핵심적 리듬을 암시한다.
적혈구 500만개, 1분 만에 온몸을 순환
한 방울의 혈액에 포함된 약 500만개의 적혈구는 1분 만에 몸 전체를 돌며 산소를 공급한다는 것은 생명현상의 효율성, 그리고 "미시적 세계의 집합이 곧 거대한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현대생물학적 통찰과 맞닿아 있다. 이는 인체라는 ‘집합적 존재’의 철학적 개념, 곧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룬다는 동양 사상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뼈는 강철보다 4~5배 강하다
과학자들은 같은 양의 철보다 뼈가 약 4~5배 높은 압축강도를 자랑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1inchi³(㎤)의 인간 뼈는 최대 8626kg의 하중을 버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칼슘이 부족하거나 질병이 있으면 뼈가 스폰지처럼 약해져 쉽게 부러진다. 이는 ‘강인함과 취약성’이라는 인간 삶의 이중적 본질을 보여준다.
간은 70% 잘려도 재생된다
간은 인체에서 유일하게 70~80%를 잘라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장기다. 실제로 간 부분 절제술 후 남은 간 조직이 12개월 내 원래 크기로 회복된다는 연구가 다수 국제 논문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 재생능력 뒤에는 백혈구인 호중구가 분비하는 성장인자가 결정적 역할을 하며, 면역계와 장기의 협력적 복원이 핵심임이 밝혀졌다. 간은 ‘생명의 복원력’을 상징하며, 철학적으로 ‘회복과 갱신’을 보여준다.
뇌,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뇌는 신체 기관 가운데 통증을 직접 느끼지 못한다. 머리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실은 뇌가 아닌 신경, 혈관 등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 중심부 편도체가 통증의 조절 및 제어를 담당하며, 신경 세포가 자체적으로 통각을 차단하며 고통을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뇌가 자신을 ‘통증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원리는 인간 의식과 존재론적 자유의 은유로도 해석된다.
장 내 미생물, 100조 마리 이상의 공생자: 면역의 70% 결정
인간의 장 속에는 100조개가 넘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이 공생하며, 그들은 전체 면역력의 70% 이상을 결정한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면역력 저하와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된다. 서구와 동양 사상에서 ‘공생하는 생명’의 책무와, 미생물과 인간이 함께 진화해온 생태적 ‘연대’의 의미를 문화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의 신체는 생물학적 기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생하는 ‘생명 유기체’로서, 철학자들은 변동하는 ‘존재’로 관찰한다. 뼈와 간의 복원력, 점막·세포의 교체 주기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는 진화의 산물임이 밝혀졌다.
면역과 장내 미생물의 상호작용은, 인간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시사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의 몸은 우주적 경이와 함께 셀 수 없이 많은 복잡한 장기, 미생물, 세포가 서로 협력하며 존재를 지속한다. 이 ‘자기복구적 엔지니어링’과 생의 의지를, 과학과 철학의 교차점에서 조명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될 지적 모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