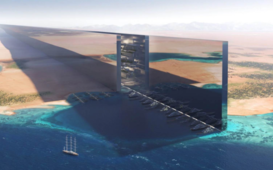[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7월 29일 현재 서울 종로구와 중구는 9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지만, 산지 비중이 높은 노원·은평구는 단 2일에 그쳤다. 도봉·강북구 역시 3~4일 수준으로, 같은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밤더위 체감’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 현상의 핵심 배경은 바로 ‘도시 열섬 효과’(Urban Heat Island)다.
열대야는 밤사이(오후 6시~익일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 이상을 기록하는 밤을 의미하며, 보통 아스팔트·빌딩 밀집 등 인공 열발산이 많은 도심일수록 기록이 두드러진다.
28일 밤, 서울 도심에서는 최저기온이 28.8℃에 달해 9일째 열대야가 관측됐다. 이는 2018년 7월(29.2℃) 당시와 거의 맞먹는 극한 수치다.
반면, 은평구(24.3℃)·관악구(24.6℃) 등 외곽 산지구역은 밤기온이 뚝 떨어지며 열대야 일수가 크게 줄었다. 실제로 도시 중심 영등포구의 밤 최저기온이 외곽보다 최대 4.3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은 낮 동안 건물이 흡수한 열이 밤에 방출돼 기온 하락이 더뎌지고, 외곽 산지구는 녹지대 효과와 환기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기온이 빠르게 내려간다”고 분석한다.
행정구별로 보면, 7월 29일까지 서울 25개 자치구별 열대야 일수에는 아래와 같은 현격한 차이가 드러난다.

도심 열대야, 점점 더 극심해진다
서울 전체 평균 열대야 일수는 2020년 13일에서 2024년 48일로 껑충 뛰었다. 기상청 장기 통계에 따르면 40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폭염·열대야의 증가세는 ‘도시 열섬’과 기후위기 복합 효과로 분석된다.
기상 전문가들은 앞으로 서울 도심의 열대야 일수·강도 모두 더 고조될 것으로 경고한다. 도시 집중 개발·노후 건축물 증가·녹지 훼손 등이 주요 원인이다. 반면 녹지·수변 공간 확충, 기후대응형 건축, 자치구별 맞춤형 쿨링정책이 필수 대응 전략으로 꼽힌다.
‘열섬’ 미래, 그리고 생존 전략
도심지역과 서울외곽지역간 열대야 격차 심화가 ‘도시 환경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기상청은 2025년 하반기 ‘폭염백서’를 첫 배포, 자치구별 실태공개를 예고했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빌딩밀집 지역구는 거의 9일가량 열대야를 보였다.
이처럼 ‘서울의 밤더위’는 평범한 날씨 뉴스 그 이상, 도시환경·사회적 불평등이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로 작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