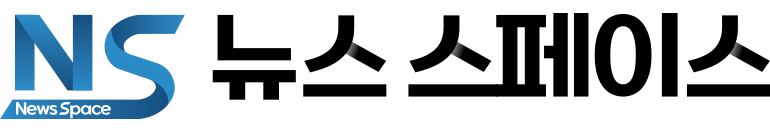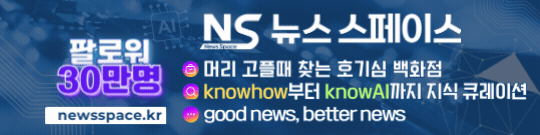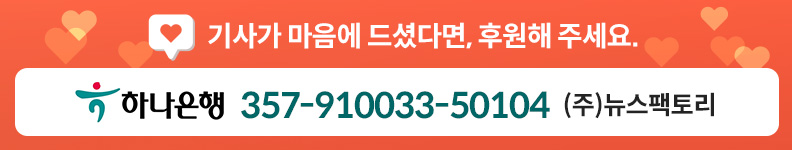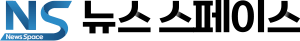[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야생동물은 살상하는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을 구별하고 그에 따라 두려움 반응을 조절한다고 인도 과학대학교(Indian Institute of Science)의 새로운 연구가 밝혔다.
Ecology Letters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냥꾼과 어부는 야생동물에게 일관되게 두려움 반응을 유발하는 반면, 관광객과 연구자에 대한 반응은 훨씬 더 다양하며, 경우에 따라 동물들이 수동적인 인간의 존재 주변에서 오히려 경계를 늦출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iisc.ac, timesofindia.indiatimes, newindianexpress, phys.org, thehindu, datadryad에 따르면, 인도 과학연구소(IISc) 연구팀이 30년간의 글로벌 데이터를 메타분석한 결과, 야생동물은 사냥꾼과 어부 같은 치명적 인간에게 노출될 경우 경계심이 크게 증가하고 먹이 활동 시간이 평균 20-30% 줄어드는 반응을 보인다. 반면 관광객이나 연구자와 같은 비치명적 인간에 대한 반응은 훨씬 약하고 변동성이 크며, 일부 종에서는 경계심이 오히려 10-15% 감소하는 경우도 관찰됐다.
이 메타분석은 먹이 활동, 경계 행동, 이동 패턴 등 세 가지 핵심 행동 변화를 다수 생태계와 종에 걸쳐 검토한 것으로, 위험 할당 가설(risk allocation hypothesis)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치명적 인간 vs 비치명적 인간
치명적 인간 활동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경계율은 사자 같은 천적 대비 2배 이상 높아지며, 먹이 섭취 시간이 유의미하게 단축된다. Times of India 보도에 따르면, 사냥 노출 지역 동물들은 지속적 위협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와 번식 기회를 희생하며 생존 우선 전략을 취한다. 반대로 관광객 접근 시 반응 강도는 50% 이상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인간 기반 시설(도로·정착지) 주변에서는 일부 초식동물이 경계를 늦추는데, 이는 천적 회피 효과로 인한 '인간 보호막(human shields)' 현상으로 분석된다. Maria Thaker 교수는 "도로변 초목 제거가 방목지를 제공하나 차량 충돌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최상위 포식자 신화 재검토
인간을 '최상위 포식자(super-predator)'로 보는 기존 관점을 뒤집는 핵심은 맥락 의존성이다. Shawn D'Souza 주저자는 "인간은 항상 '극도로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치명적 활동만 강한 공포를 유발한다"고 밝혔다.
Phys.org는 독일(연중 사냥, km²당 4배 수확량)과 미국(3개월 사냥) 비교 연구를 인용하며, 장기 고강도 사냥시 공간 회피가 25배 증가한다고 전했다.
생태·보전 전략 변화
이러한 행동 변화는 생태 연쇄작용을 초래한다. 과도한 방목으로 식생 파괴가 가속화되고, 포식자 이동 패턴이 왜곡될 수 있다. Kartik Shanker 교수는 "제한적 제거(culling)가 야생동물 유입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인간과 동물간 야생 충돌(연 500건 이상) 관리에 활용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향후 연구는 종 특성·노출 이력을 통합한 예측 모델 개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