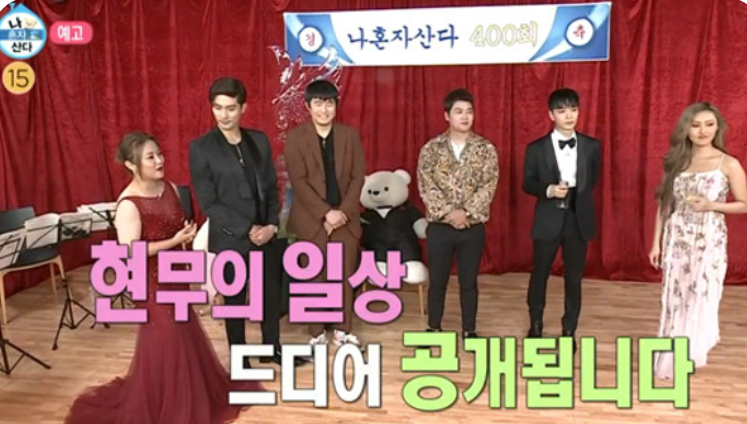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국내 1인 세대가 처음으로 1000만을 넘어 전체 세대의 42%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의 가족 구조와 사회경제 지형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8월 27일 발간한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체 세대 수는 2411만8928세대로, 이 중 1인 세대가 1012만2587세대로 집계돼 4년 만에 100만 세대가 증가하는 등 확연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인 세대 비중은 2020년 39.2%에서 42%로 2.8%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나홀로 세대’임을 의미한다.
반면, 전통적 가족의 상징인 4인 이상 가구는 461만 세대에서 394만 세대로 줄어들며 400만 선이 4년 만에 무너졌다. 4인 가족은 약 10년 만에 300만 세대 선까지 떨어지며 가족 구성의 근본적 변화를 반영한다. 이에 반해 2인 세대는 540만에서 601만 세대로 늘어나 ‘부부+자녀 1명’이나 동거 형태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인 세대의 연령별 분포는 70대 이상 노인이 207만 가구로 가장 많고, 60대 189만, 30대 171만 순이다. 노년층의 1인 세대 비중이 39.19%에 달해, 배우자 사별 등으로 인한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한 점도 확인됐다.
이 같은 변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1인 가구 대상 소포장 식품 시장과 소형 가전제품 수요가 크게 성장하는 등 소비 구조 변화가 뚜렷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인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2019년 대비 5.8% 감소했으며,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223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44.9%에 불과해 경제적 취약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커 월세 거주 비율이 42%로 전체 평균의 두 배에 달해 주거비 상승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인구와 가족 구조의 변화는 기존 4인 가족 중심의 복지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며 정책 대전환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 재생산의 관점뿐 아니라 인간 존엄성과 다양성까지 포용하는 포괄적 정책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번 통계연보는 우리 사회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다수 지방자치단체는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과 사회적 고립 예방, 주거 안정 등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은 각각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 고독사 위험 등 취약 문제 해소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1인 세대의 급증과 전통적 가족 형태 붕괴는 한국 사회의 인구·경제·복지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신호탄이다. 향후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이에 맞춘 정책 대응이 긴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