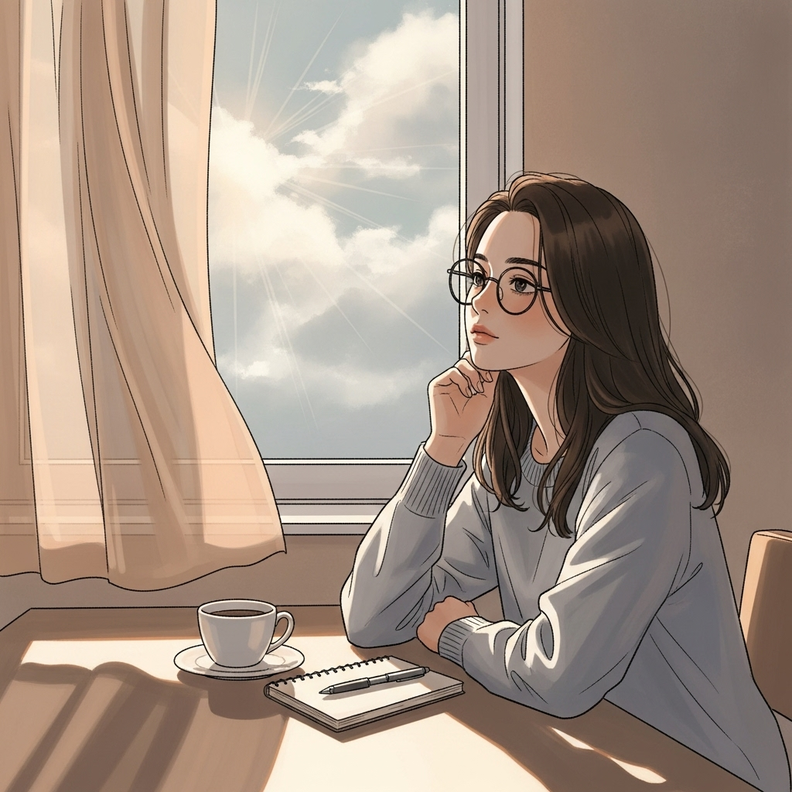
◆ 고쳐야 한다는 말의 무게
"나 이런 성격 좀 고치고 싶어."
회사에서는 리더로서 단호하고 냉정해야 하고, 집에서는 엄마로서 아이들에게는 좀 더 차분히 기다려주고 다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이 꼬이면 금세 마음이 조급해지고, 말 한마디에 오래 머무르며, 지나간 일에 괜히 해석을 덧붙인다.
직급이 올라가고 나이는 들어가지만 나는 여전히 '고쳐야 할 나'와 '그래도 괜찮은 나' 사이에서 늘 흔들린다. 그래서 요즘 셀프 코칭을 통해 그 감정의 습관을 조금씩 고쳐보는 중이다.
사람들은 흔히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을 둘로 나눠 말한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둘 중 하나로 단정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감정을 품고 있으며, 살아온 경험과 환경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따라 달리 드러난다. 어떤 시기에는 불안이 더 크고, 어떤 날에는 기쁜 마음이 앞선다.
결국 완벽히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사람은 없다는 말이다.
◆ 반드시 고쳐야만 할까
마틴 셀리그만은 기존 심리학이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리학은 인간의 결함을 고치는 학문이 아니라, 인간의 강점을 발전시키는 학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칭 역시 이 관점 위에 서 있다. '무엇이 잘못되어 고쳐야 하는가'보다는 '어떤 잠재력이 있고 무엇이 가능한가'를 묻는다.
이것이 질병 모델을 벗어나 성장 모델로 가는 출발점이다.
얼마 전, 한 팀장이 찾아왔다. 주변에서 자신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는데,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의견을 내다 보니 누구보다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위험을 예측할 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부정적이고 예민하다는 평가만 돌아와서 속상하다는 거였다.
팀장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내겐 팀장의 말이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부정적인 비관이 아닌 '조직을 지키려는 책임감'이 느껴져서 물었다.
"혹시 그 신중함으로 인해 리스크를 예방했던 경험이 있나요?"
"팀장님의 신중함과 우려는 조직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끼치나요?"
그는 생각에 잠겼다가 본인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했다.ㆍ
◆ 치유는 방향을 바꾸는 일
코칭은 고통을 들춰내어 해결하고 덮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데 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일상생활에서도 가급적 '고쳐야 한다'는 말을 조금 덜 쓰려고 노력한다.
"이 경험이 내게 어떤 의미일까? 이 부정적 감정이 사실은 나를 어떻게 지키려 했던 걸까?"
부정적 감정도 알고 보면 나를 지켜주는 오래된 습관이다.
앞으로는 그 습관이 자동으로 나를 끌고 가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어떤 감정에 더 머물지 내가 먼저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다.
★ 칼럼니스트 ‘래비(LABi)’는 어릴 적 아이디 ‘빨래비누’에서 출발해, 사람과 조직, 관계를 조용히 탐구하는 코치이자 조직문화 전문가입니다. 20년의 실무 경험과 워킹맘으로서의 삶을 바탕으로, 상처받은 마음의 회복을 돕는 작은 연구실을 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