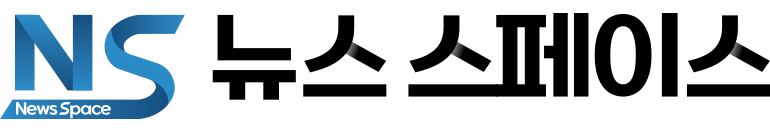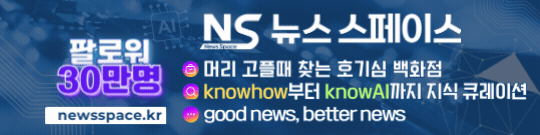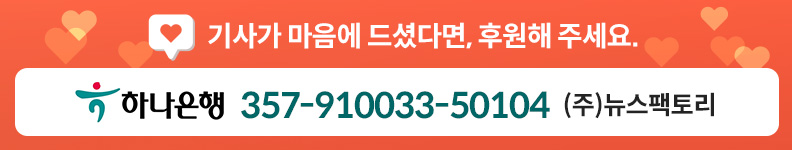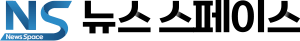[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편집자주> 유튜브, 인스타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받지 않았다', '광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는 뜻의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생겼다. 비슷한 말로 "내가 궁금해서 결국 내가 정리했다"는 의미의 '내궁내정'이라고 이 기획코너를 명명한다. 우리 일상속에서 자주 접하는 소소한 얘기거리, 궁금증, 호기심, 용어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최근 올리브영 매장과 드럭스토어에서 낯선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샴푸나 화장품을 고르던 소비자들이 제품을 손에 들고 뒷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이다. 예쁜 패키지나 모델의 얼굴이 아니라,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전성분표'를 찍는다.
이렇게 찍은 사진을 화해, 글로우픽, 피꾸 같은 성분 분석 앱에 업로드하면 앱은 즉시 제품 속 성분을 분석해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EWG 등급, 계면활성제 종류 등을 알려준다. 마음에 들면 구매하고, 의심스러운 성분이 보이면 다시 선반에 올려놓는다.
이런 '전성분으로 거르는 소비'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오픈서베이의 '뷰티 트렌드 리포트 2020'에 따르면 소비자 70%가 성분을 고려해 제품을 구매한다고 응답했다.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도 2024년 4월 한 달간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분 관련 검색량이 전년 대비 3배 증가했으며 인디 뷰티 브랜드 거래액은 46배나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전성분표의 탄생: 소비자 피해가 만든 제도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화장품 전성분표지만, 그 뒤에는 소비자 피해의 역사가 숨어 있다. 2000년대 초반 국내에서는 화장품 부작용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2006년 일본 명품 화장품 SK-II 브랜드의 중금속 검출 사건은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중국 질검총국이 일본에서 수입된 SK-II 화장품에서 크롬과 네오디뮴 등 성분배합금지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중국을 시작으로 국내까지 파문이 확산됐고, 이후 미백 화장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가 하면 영유아 제품 사용 후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200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위해정보 중 화장품으로 인한 피부 발진, 두드러기, 만성 가려움 등이 전체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 불안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당시 소비자의 요구는 단순했다. “내가 바르는 제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고 싶다”는 것. 그러나 당시에는 전성분 공개 의무가 없었고, 기업들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성분 공개를 거부했다.
소비자 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국민 청원, 입법 활동 등이 이어졌다. 결국 2008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전성분 의무 표시 제도'를 전면 시행하면서 모든 화장품 용기와 포장에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됐다.
이렇듯 전성분표는 소비자의 안전 요구가 만들어낸 제도의 흔적이자,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맺어진 일종의 약속이다.

존재하지만 ‘읽히지 않는 정보’가 된 전성분표
17년이 지난 지금, 전성분표는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전성분은 국제화장품원료명(INCI)을 한글로 음역하거나 번역해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제품 성분표에는 ‘정제수’,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같은 화학적 용어가 줄지어 등장한다. 이는 표면상 한글이지만 실제로는 전문가 수준의 해석을 요구하는 과학 용어에 가까워 일반 소비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 글씨 크기가 지나치게 작다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는 성분표를 확인하고 싶어도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보다가 포기한다”는 반응을 반복해왔다.
특히 이 문제는 샴푸에서 두드러진다. 전성분표에는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샴푸의 첫 번째 성분은 대부분 정제수다. 정제수에 대한 별도 화장품 기준은 없지만 한국약전(KP) 등의 공정서를 따라 이온교환·증류·역삼투압 등으로 불순물을 제거한 물을 사용한다.
KP와 의약외품 기준에는 pH 5.0~7.0 등 시험 항목이 설정돼 있으며, 제조사는 이 기준에 적합한 정제수를 쓰면 된다. 그러나 전성분표에는 어떤 공정으로 만든 물인지, 어떤 등급의 정제수인지까지는 표시되지 않는다. 결국 제품 내용물의 50~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정제수가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 두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구조적 역설이 발생하는 셈이다.
성분으로 제품을 읽는 '디코딩 소비자'의 등장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소비 행태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성분 분석 앱인 ‘화해’는 2024년 기준 누적 다운로드 1,200만건을 넘어섰고, 글로우픽을 비롯한 성분 분석 앱들의 사용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전성분을 촬영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브랜드 인지도, 향, 모델, 광고 이미지를 보고 골랐다면 이제는 첫 번째 성분이 무엇인지, 계면활성제는 어떤 종류인지, 알코올·실리콘·향료가 들어있는지, 함량이 표시돼 있는지를 따진다.
이런 인식 전환은 MZ세대의 신중한 소비 문화와 맞물려 더욱 확산되는 중이다. 이들에게 제품 구매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실천하는 행위다. 클린 뷰티, 비건 뷰티, 지속 가능성 같은 키워드가 유행어가 아니라 구매 기준이 된 배경이다.

전성분표를 '숨기지 않는' 브랜드’의 등장
이런 변화 속에서 일부 브랜드는 전성분표를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브랜드 철학을 드러내는 창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무첨가’, ‘저자극’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성분의 종류와 함량을 수치로 공개하는 방식이다.
클린 뷰티를 표방하는 브랜드들은 베이스 성분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비건 인증과 EWG 그린등급 성분을 강조해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전성분표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 구축 도구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읽히는 전성분표'를 만든 히니스
이런 흐름에 동참한 대표적인 브랜드로 히니스를 꼽을 수 있다. 이 브랜드는 전성분표부터 차별화를 시도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베이스 성분이다. 일반적인 샴푸와 두피 토닉이 정제수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히니스는 전라남도 장성 축령산의 편백수를 사용한다. 단순히 '편백 성분 함유'라고 표현하는 대신, 두피 토닉에는 편백수 79%, 샴푸에는 45%가 함유됐다는 점을 명확한 수치로 드러낸다. 제품의 절반 이상이 무엇으로 채워졌는지를 숫자로 보여줬다.
여기서 더 나아가 히니스는 에센셜 오일의 함량까지 ppm 단위로 기재한다. 에센셜 오일이나 식물 추출물을 '소량 함유'로만 애매하게 표기하는 행태와 대조적이다. ppm은 ppb보다 1,000배 큰 단위로, 함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제품을 '보이는 구조'로 판단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열어두는 방식이다. 전성분표가 더 이상 작은 글씨로 숨겨진 '귀찮은 정보'가 아니라, 가장 솔직한 브랜드 설명서가 되는 순간이다.

언제나 진실은 뒷면에 있다…제품의 眞價도 드러나는 법
전성분표는 단순한 법적 요건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피부에 바르고 두피에 닿는 물질에 대한 설계도다.
샴푸의 뒷면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 소비는 바뀐다. 소비자는 향이나 광고가 아니라 성분 구조로 제품을 평가하고, 브랜드는 말이 아니라 '뒷면의 진심'으로 검증받는다.
2008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전성분 의무 표시 제도가 17년이 지난 지금, 비로소 제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이제 전성분표를 작은 글씨로 숨기는 시대는 끝났다. 소비자가 읽고,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정보로 만드는 것이 브랜드의 새로운 과제가 됐다.
MZ세대가 샴푸 뒷면을 찍는 이유는 단순하다. 진실은 앞면이 아니라 뒷면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