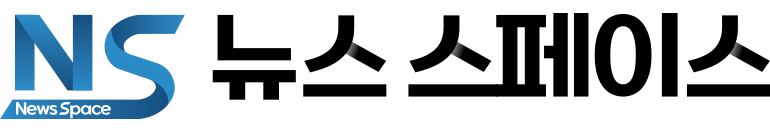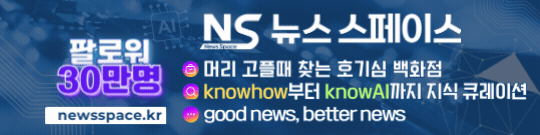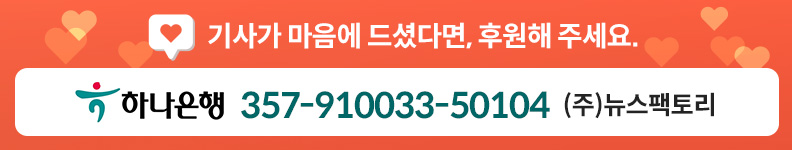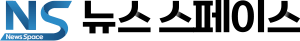너무 안타깝다. 참 가슴 따뜻해지는, 말 그대로 ‘착한 영화’이기 때문이다. 흥행 전선에서는 일찌감치 이탈했지만, 연휴의 끝자락에 이 영화를 선택한 건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 하자면, 아주 오래전 동생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다. 이제는 가슴 먹먹함을 넘어, 기억조차 세월의 저편으로 희미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현듯 눈시울이 붉어지는 순간이 있다. 이런 영화를 마주할 때는 예외 없이 그렇다.
그래서 먼저 말해두고 싶다. 가족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시거나, 어쩌면 이번 작품은 피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추신도 아니지만, 이 말은 꼭 남기고 싶었다.)
주인공(최우식)은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을 때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숫자가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을 겪는다. 이 숫자는 오직 그에게만 보이고, 결국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공승연)와의 관계에도 균열을 만든다.
주위에서 팔자가 사납단 소리를 듣는 엄마는 이미 남편과 큰아들을 떠나 보냈다. 이제 남은 혈육은 둘째 아들 하나뿐인데, 그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앞에 놓인다.
영화는 이렇게 다소 말이 안 되는 설정과 익숙한 신파의 문법으로 출발한다. 전개 역시 크게 새로울 것은 없고, 솔직히 말해 초반에는 약간의 실망감도 남는다.
하지만 마지막에 지극히 평범한 반전, ‘왜 엄마가 해준 밥만 기다렸을까? 내가 요리해서 엄마에게 밥을 해드린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까?’ 이야말로 이 영화가 건네는 진짜 질문이다. 그 질문 하나로 허전하던 감정의 빈틈이 채워지고, 미소를 남긴 채 크레딧이 올라간다.
<헬로우 고스트>처럼 눈물을 쏟아내게 만드는 작품은 아니다. 대신 ‘딱 그 정도의 착한 감정’으로 마무리된다. 아마도 이 담백함이, 이 영화가 상업적으로 고전한 이유일 것이다.
◆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 ‘엄마’
아플 때도, 무서울 때도, 배고플 때도 무의식적으로 부르게 되는 단어. ‘엄마’다.
어쩌면 신은 엄마를 가장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차례로 만들어냈는지도 모르겠다. 인생은 결국 ‘엄마’로 시작해 ‘엄마’로 끝나는 여정 같아서다.
비교적 최근 흥행한 <좀비딸> 역시 ‘엄마’를 ‘아빠’로 바꿔 세운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 깔린 정서는 다르지 않았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통해 관객의 눈시울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넘버원>과 같은 계보에 놓인 작품이다.
이 영화 역시 ‘엄마의, 엄마에 의한, 엄마를 위한’ 이야기다. 아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고, 죽을 것 같았던 엄마 역시 살아남는다.
다만 이 영화에서 아쉬운 지점은, 감동을 쌓아 올리기보다 ‘울게 만드는 장치’가 먼저 보인다는 점이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뒤늦게 슬퍼지는 구조. 쥐어짜낸 눈물은 감동에 젖어 흐느끼는 눈물과는 결이 다르다. 이 지점이 이 영화의 분명한 한계다.
◆ <넘버원>이라는 제목, 과연 적절한가
제목 또한 다소 아쉽다. ‘넘버원’이라는 단어는 보통 ‘최고’나 ‘유일함’을 연상시키지만,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제목은 오히려 ‘줄어들다 마지막에 남는 숫자’, 그리고 그 이후 리셋되는 운명을 상징하는 장치처럼 느껴진다.
감정선을 조금 더 서서히 끌어올렸다면 어땠을까. 마치 플라이낚시로 월척을 낚아 올리듯, 관객의 감정을 천천히 끌어올렸다면 입소문과 흥행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영화는 끝까지 비교적 무미건조한 호흡을 유지한다.
담백한 영화를 선호하는 관객에게는 분명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다만 자극적인 이야기와 빠른 전개에 익숙한 요즘의 관객층에게 ‘착한 영화’가 흥행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다.
다시 코칭 이야기다. 코칭 현장에서 종종 던지는 질문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요?”
“당신의 인생 멘토는 누구입니까?”
여러 답이 나오지만, 이 질문 앞에서 가장 자주 돌아오는 이름은 ‘엄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해 자식을 낳고,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살다 보면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는 횟수는 해마다 줄어든다. 설과 추석, 많아야 1년에 두 번 내려가 두 끼씩 먹는다고 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1년에 네 끼.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 계신 엄마와 앞으로 몇 끼의 밥을 더 나눌 수 있을까. 대접만 받지 말고, 햇반이라도 좋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엄마에게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차려 드리면 어떨까. 영화는 이렇게 끝난다…(to be continued)
P.S. 사실 최우식이라는 배우를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다. 관심의 영역 밖에 있던 배우였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직장인의 얼굴도, 막내아들의 투정도, 위암 말기 환자의 모습도 과하지 않게,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소화해냈다. 배우 최우식의 재발견, 적어도 나에게는 꽤 의미 있는 수확이었다.
* 칼럼니스트 ‘올림’은 건설,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식음료, 소재·화학, IT, 패션 등 다양한 업계를 거쳐온 홍보전문가입니다. 인증코치이기도 한 그는 ‘영원한 현역’을 꿈꾸는 미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