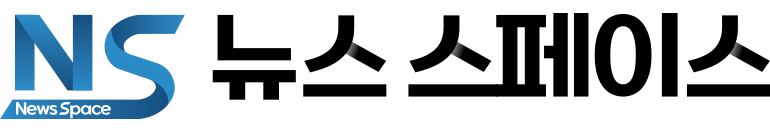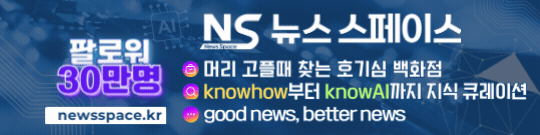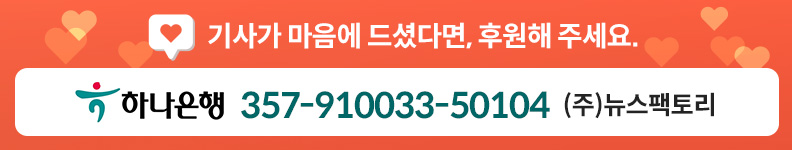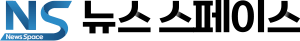브랜드 컨설팅 회사에서 다양한 기업의 브랜드 체계를 짜주며 나는 늘 생각했다. 멋진 슬로건과 로고, 브랜드 체계를 만들어주지만, 과연 이 기업들이 내부에서도 이 가치를 지키고 있을까? 제안서 속의 화려한 전략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
그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당시 ‘바른먹거리’라는 철학으로 유명했던 한 식품 기업의 마케팅본부로 이직을 결심했다. 밖에서 볼 때 그곳은 브랜드 가치가 가장 잘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다.
'진짜 내부에서도 그 가치가 지켜질까? 내가 확인해 보겠어.' 호기심과 포부가 가득했다.
입사 며칠 후, 점심시간이었다. 반찬으로 추억의 ‘분홍 소시지’가 나왔다. 어릴 적 도시락 반찬으로 최고였던 그 맛이 반가워 리필까지 하며 맛있게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선배가 말없이 책 한 권을 내밀었다.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에 관한 책이었다.
“래비님, 우리 회사에서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 매우 엄격해요. 금지하고 있는 첨가물이 왜 위험한지는 알아야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얼굴이 화끈거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지금도 이직해 오는 경력직 연구원이나 마케터들이 “왜 다른 회사에서는 다 쓰는 첨가물을 여기선 못 쓰게 하냐, 맛을 내기가 너무 어렵다”며 볼멘소리를 한다.
하지만 회사는 타협하지 않는다. 그 엄격함. 불편하고 비효율적일지라도 원칙을 고수하는 태도, 그것이 차별화를 만든다.
그때 깨달았다.
브랜드의 가치는 벽에 걸린 액자 속 문구가 아니라, 쉽게 타협하지 않는 ‘불편한 엄격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 엄격함이 고객에게는 신뢰가 되고, 브랜드의 생명력이 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배웠다.
많은 기업이 멋진 비전과 미션을 만든다. 액자에 넣어 사무실 벽에 걸어둔다. 하지만 의사결정 상황에서, 회의실 책상 위에서, 현장의 작은 선택들에서 그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빈말이다.
진짜 브랜딩은 불편을 감수하는 매일의 실천 속에 있다.
그렇게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마케팅 현장을 달렸다. 당시엔 야근이 미덕이던 시절이었고, 나 역시 성과를 내고 싶어 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탈이 났다.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더니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차가운 수술실로 이동하던 복도, 누워있는 내 시야에 천장에 달린 TV 모니터가 들어왔다. [KBS 드라마 작가 공모전 모집]
순간,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마취 주사가 들어가기 직전, 몽롱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글을 쓰고 싶었던 사람이잖아. 다시 눈을 뜨면,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하러 떠날 거야.’
수술은 잘 끝났고, 내 마음은 이미 회사를 떠나 있었다. 퇴원 후 나는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혔고, 인도행 비행기 표를 검색했다. 인도로 가서 갠지스강을 바라보며 글을 쓰고, 지친 몸과 마음을 씻어내고 싶었다. 서른 즈음,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자아를 찾기 위한 도피’였다.
그때였다. 지주사에서 연락이 왔다.
“래비님, 그만두지 말고 여기 와서 일해보면 어때요? 회사의 철학과 혁신과제를 연구하는 팀이니 마케팅보다는 업무 강도가 덜할 거예요.”
솔직히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생각했다. 몇 달만 일하고 인도행 비행기 티켓값을 벌면 바로 떠날 생각이었다. 그런데 막상 와서 일을 하다 보니,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마케팅이 ‘제품’을 고객에게 팔기 위해 컨셉을 잡고 가치를 전달하는 일이라면, 조직문화는 ‘회사’라는 상품을 직원들에게 팔기 위해 가치를 만들고 소통하는 일이었다. 대상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았다.
‘꼭 눈에 보이는 제품을 개발하고 팔아야만 마케팅인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회사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도 보이지 않는 마케팅이 아닐까?’
분홍 소시지를 먹으며 배웠던 ‘철학의 엄격함’은 조직문화를 설계할 때 원칙을 세우는 기준이 되었고, 마케팅본부에서 익힌 ‘고객(직원) 지향적 사고’는 딱딱한 회사의 가치를 말랑하게 전달하는 무기가 되었다.
인도행 티켓은 결국 예매하지 못했다. 대신 나는 ‘사람’이라는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여행지를 탐험하기로 했다.
그때 내가 인도로 떠났다면 지금쯤 드라마 작가가 되었을까?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건, 도망치려 했던 그 순간조차 내 커리어는 새로운 재료를 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인생의 방향은 때로 수술실 천장의 TV 광고 하나로, 선배가 건넨 책 한 권으로, 그리고 우연히 받은 제안 하나로 바뀌기도 한다. 그러니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아무리 우회로처럼 느껴져도, 그곳에서 배우는 ‘불편한 진실’들이 당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갈 것이다.
[래비가 제안하는 커리어 블렌딩 2단계 질문]
그럼 래비가 제안하는 <커리어 블렌딩 2단계 질문>으로 생각의 뼈대를 세워보자.
STEP 1. [Alignment] 겉과 속이 일치하는가? (가치의 내재화)
-화려한 포장지(타이틀, 연봉)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의 알맹이(철학)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켜야 할 나만의 원칙은 무엇인가?
-[질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 떳떳한 본질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가?
STEP 2. [Navigation] 도망치고 싶은가, 나아가고 싶은가? (방향의 재설정)
-위기는 종종 진짜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수술실 앞이나 퇴사 직전의 순간처럼,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비로소 보이는 ‘가슴 뛰는 일’은 무엇인가?
-[질문] 지금 내가 선택하려는 변화(이직, 유학 등)는 현실로부터의 ‘도피’인가, 아니면 내 안의 열정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인가?
[6화 예고]
인도행 비행기 표 대신 내가 탑승한 곳은 사내 조직문화 혁신 TFT, ‘C-큐빅(C-Cubic)’이었다. “조직문화가 밥 먹여줘?”라는 냉소 섞인 시선 속에서 부의장을 맡으며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사람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 오묘한 매력에 빠져 덜컥 교육대학원 원서까지 내버리고 마는데... 마케터에서 HR 전문가로, 맨땅에 헤딩하며 시작된 래비의 ‘진짜 공부’ 이야기가 펼쳐진다.
★ 칼럼니스트 ‘래비(LABi)’는 사람과 조직의 성장을 고민하는 코치이자 교육·문화 담당자입니다. 20년의 치열한 실무 경험과 워킹맘의 일상을 재료 삼아, 지나온 모든 순간이 어떻게 현재의 나로 ‘블렌딩’되는지 그 성장의 기록을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