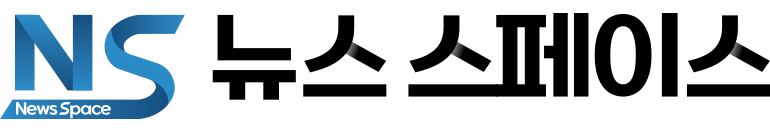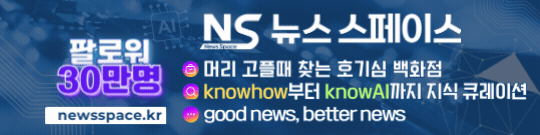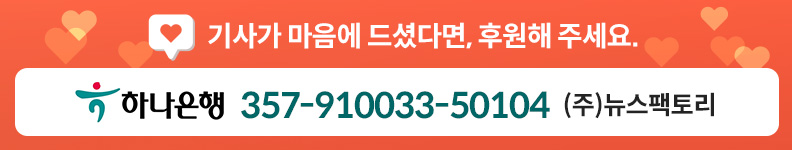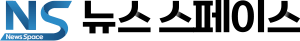‘뭐야, <왕의 남자> 같은 영화인가? <사도> 쪽일까, 아니면 <광해> 느낌일까?’
사극 장르를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개봉 전부터 오랜만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듯한 한국영화라는 점에서 자연스레 호기심이 일었다. 여기에 유해진, 전미도 배우까지 출연한다니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영화가 시작되고 한 시간가량, 내 얼굴 근육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재미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참신한 건지, 그렇고 그런 건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았다.
유해진 배우의 원맨쇼에 가까운 전개로 출발하는데, 그가 이전 작품들에서 보여준 연기의 연장선처럼 느껴져 새로움은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유해진 배우를 좋아한다.)
영화를 다 보고 든 생각.
제목은 <왕과 사는 남자>이지만, 차라리 <왕과 죽은 남자>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전미도 배우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통해 팬이 되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 매력이 충분히 살아나지 못한 듯해 아쉬움이 컸다. 이는 배우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역할과 서사의 한계에 더 가까워 보인다.
◆ 실화 기반 ‘팩션’의 한계, 그리고 부족한 뒷심
왕이 호랑이를 죽이기 전 내지르는 포효 장면은, 호랑이의 포효보다도 묘하게 관객의 심장을 건드린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겠구나”라는 기대가 생기는 대목이다.
그러나 고조될 듯하다가 이내 힘이 빠지고, 웃음을 기대하면 무표정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한다. 극적 긴장감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채 흩어지는 느낌이다.
전형적이긴 하지만, 결국 역모 세력을 처단하는 서사 구조라면 최소한의 박진감과 카타르시스는 필요했을 텐데, 그 부분이 다소 아쉽다. 담담하고 묵직한 톤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충분히 우려낸 감흥을 기대했던 관객에게는 ‘딱 그 정도’에서 멈춘 인상이 남는다.
평소 호감이 가는 배우들, 그리고 이름만으로도 기대감을 주는 감독이었기에 실망감이 더 크게 다가온 측면도 있다. 단종과 수양대군이라는 익숙한 역사적 인물을 다루면서도, 관객의 호기심을 꼬리에 꼬리를 물 듯 끌어가는 대신, 꼬리에서 머리로 끝내 닿지 못한 채 마무리된 느낌이다.
(*이 글은 순수하게 개인적 감상에 기반한 리뷰임을 밝힌다.)
◆ ‘반듯한 하고잡이’가 성공하는 사회를 꿈꾸며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왜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의외로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까. 반대로 누가 보아도 편법과 기회주의에 가까워 보이는 이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장면을 종종 마주한다. ‘정의 구현’이란 말이 여전히 이상적으로 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듯한 하고잡이’가 결국 보상받는 사회를 마음속으로 그려본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활활 타오르지는 못했지만 꺼져가던 불씨에 장작 한 토막을 더 얹어준 정도의 위안은 남긴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 바로 그 순간을 조금 더 현명하게 넘기고 다시 의지를 다잡는다면, 그 작은 불씨가 언젠가 큰 횃불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to be continued)
P.S: 왕 역을 맡은 배우의 연기는 인상적이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한명회 역의 유지태 배우는 또 한 번 ‘유지태’다운 눈빛 연기를 보여준다. 묵직한 존재감에는 박수를 보낸다.
(*명색이 코칭 칼럼이지만, 오늘은 리뷰로만 남긴다. 독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바란다.)
* 칼럼니스트 ‘올림’은 건설,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식음료, 소재·화학, IT, 패션 등 다양한 업계를 거쳐온 홍보전문가입니다. 인증코치이기도 한 그는 ‘영원한 현역’을 꿈꾸는 미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