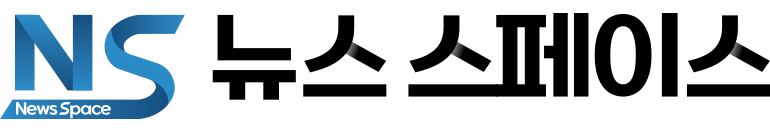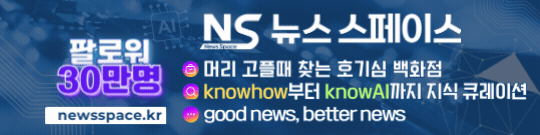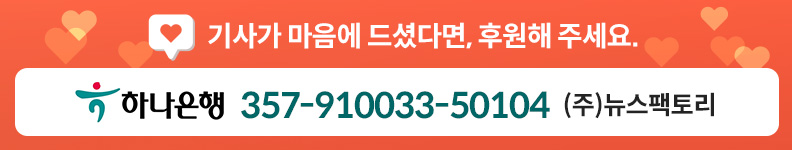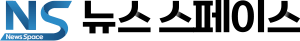개인적으로 열렬한 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종서와 한소희 - 한소희와 전종서라는 두 배우의 만남만으로도 이 영화가 궁금해졌다.
보통 어떤 작품을 꼭 봐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정작 그 영화는 이런저런 이유로 놓치고 엉뚱한 다른 영화를 보게 되는 징크스가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원래는 <직장상사 길들이기>나 <하우스메이드>를 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조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장모님 생신 저녁을 함께한 뒤 분리수거까지 마치고 나니 어렵게 확보한 주말 ‘혼영’ 시간에 맞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시간대도 맞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극장에 걸려 있던 작품이 바로 <프로젝트 Y>였다. 결국 선택의 여지 없이 이 영화를 보게 됐다.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변명으로 한동안 극장을 찾지 않았지만, 주말에 아내의 ‘허락’을 받고 누리는 혼영의 맛은 여전히 달콤했다.
◆ 제목은 그럴싸한데
제목은 묘하게 눈길을 끌었다. 실험영화 같기도 하고 상업영화 같기도 한, 졸업 작품 전시회에서 볼 법한 느낌. 그럼에도 제목이 주는 호기심이 컸다. 더구나 개성이 뚜렷한 두 배우가 주연을 맡았으니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10분, 20분, 그리고 한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짜증이 고개를 들었다. 이런 말을 하긴 조심스럽지만, 두 배우가 과연 어떤 확신으로 이 시나리오를 선택했을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감독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전달하려는 주제는 무엇이었을까. 혹시 무의식의 흐름에 맡겨 카메라를 돌린 것은 아닐까.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졌다.
서점에서 그럴듯한 제목에 이끌려 책을 샀다가, 몇 페이지 넘기지 못하고 후회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 ‘있어 보이려는’ 의도는 결국 들통난다
이 칼럼을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평소 넷플릭스 등 OTT에서 본 작품을 리뷰하되, 단순 감상이 아니라 무언가 남기는 글을 쓰고 싶었다. 그래서 콘텐츠와 코칭을 연결한 칼럼을 이어가고 있다. 이 영화 역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코치로서 고객을 만나다 보면, 의도와 달리 세션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준비한 질문과 구조, 시나리오를 꺼내 보지만 공감의 깊이가 얕아지고, 서로의 집중도 흐려질 때가 있다. 그 순간 고객도, 코치인 나도 동시에 실망한다.
글도 마찬가지다. 현학적으로 보이려 애쓰거나, 그럴듯하게 포장하려 들면 결국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좋은 글 대신 ‘좋아 보이려 애쓴 문장’만 남고 만다. 나는 평론가도, 영화 전공자도 아니지만 이 작품이 딱 그런 인상을 줬다. 솔직히 조금 씁쓸했다.
1월의 마지막 날, 가족과 함께 보낸 뒤 어렵게 얻은 두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그래도 바란다. 2월에는 더 흥미롭고 몰입할 만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기를… (to be continued)
P.S. 눈에 띄는 조연이 한 분 등장한다. 사실 넘 과장되고 <범죄도시>에서 뜬 악당만큼 아주 강렬하진 않지만 '황소'역할로 등장하는 킬러 여배우님의 삭발투혼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이 영화 이해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로 왜 만들었는지 궁금해지기에 <프로젝트 WHY>인거죠? 그럼에도 한국영화를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 칼럼니스트 ‘올림’은 건설,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식음료, 소재·화학, IT, 패션 등 다양한 업계를 거쳐온 홍보전문가입니다. 인증코치이기도 한 그는 ‘영원한 현역’을 꿈꾸는 미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