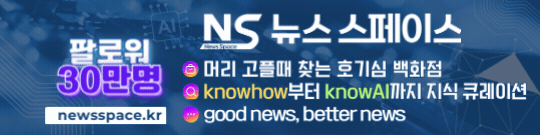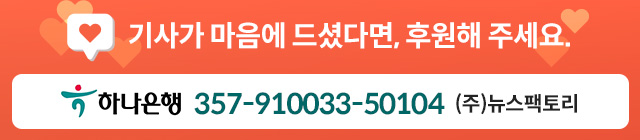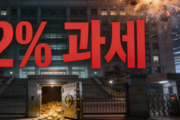[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2025년 상반기, 국내 식품·음료 상장사들의 영업이익률 순위가 '역대급' 차이로 갈렸다.
글로벌 시장으로 뻗은 삼양식품과 오리온 등은 두 자릿수대 고수익 구조로 '질주'한 반면, 내수 의존도가 높은 풀무원과 롯데웰푸드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업들의 실적 자료, 증권사 보고서, 통계 기관 정보를 취합해 국내 식품기업 12개사의 상반기 평균 영업이익률은 7.6%로 나타났다.
1위는 영업이익률 23.5%의 삼양식품이 2위는 16.0%의 오리온으로 조사됐다. 3위~5위는 하이트진로 10.1%, 오뚜기 5.6%, 빙그레 5.6% 순이었다.
6위~12위는 농심 5.5%, 동원산업 5.5%, 대상 4.4%, 롯데칠성 4.4%, CJ제일제당 3.9%, 롯데웰푸드 2.5%, 풀무원 1.9%로 나타났다.
삼양식품·오리온, 해외시장의 힘으로 두 자릿수대 영업이익률 기록
삼양식품은 2025년 상반기 매출 1조원 돌파와 함께 영업이익률 23.5%를 달성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무려 79.6%로, 사실상 K-푸드 라면의 '글로벌화'가 수익성을 견인했다. 삼양 불닭볶음면 브랜드 파워와 지역 다변화 전략(북미, 중국, 동남아, 유럽)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
오리온 역시 16.0%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오리온은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 법인 호조와 꼬북칩, 초코파이 등 스낵의 해외 인기 덕분에 해외 매출 비중 63~68%까지 확대했다. 해외 시장에서 현지화 전략과 프리미엄 제품군 확대가 영업이익률 방어에 결정적이었다.

롯데웰푸드·풀무원, 내수 시장 의존의 그늘…수익성 '꼴찌'
반면 풀무원과 롯데웰푸드는 영업이익률이 나란히 1.9%, 2.5%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풀무원은 1조6326억원의 상반기 매출에도 영업이익이 308억원에 그쳤다. 신선식품 위주(두부, 나물, 생면)의 낮은 마진 구조상 매출총이익률 24.3%인데, 물류비(7%), 판관비(14.2%),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막대하다. 실제로 100원을 팔아 24원이 남는 구조지만, 비용을 모두 제하면 정작 남는 돈은 2원이다.
롯데웰푸드 역시 2조394억원의 매출로 영업이익 507억원, 영업이익률 2.5%를 기록했다. 원재료 상승, 급증한 인건비(13% 증가), 카카오 등 주요 원재료 가격과 환율상승, 구조조정 등 비용 상승이 수익성을 계속 압박했다. 주요 상품(빼빼로, 가나, 월드콘 등)의 판가 인상을 단행했으나 원가압력이 이를 상쇄했다. 해외 매출 비중은 23%에 불과하며, 인도(9%), 카자흐스탄(6.3%) 정도만 의미 있는 수준이다.
특히 삼양식품과 오리온이 외형 성장과 영업이익률 면에서 압도적 '투톱' 구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 중심의 풀무원과 롯데웰푸드는 저성장 국면, 판가 인상 제한, 고정비 부담 등 수익성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해외매출 비중이 수익성을 가른 열쇠
이번 상반기 실적은 "수출형 기업의 시대"라는 평가에 힘을 실었다. K-푸드 글로벌 인기는 수익성 양극화를 더욱 심화했다. 삼양식품은 해외 매출 비중이 80%에 육박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번 셈이었다. 반면 내수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풀무원, 77% 수준의 롯데웰푸드는 저마진 구조와 내수시장 저성장 국면에 막혀 답답한 실적을 냈다.
2025년 하반기도 해외 시장 실적이 전사 실적 개선의 열쇠가 될 것으로 증권가와 업계는 관측했다. 한국경제가 주도하던 내수 기반 모델이 수익성을 위협받는 반면, 현지화 전략과 브랜드 파워, 지역 다변화에 성공한 수출형 식품기업은 글자 그대로 '수익률 초격차'를 기록했다.
하나증권은 “주요 음식료 업체의 내수 매출 성장은 1% 내외에 그쳤다. 하반기도 해외 실적이 실적 개선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내수 의존으로 수익성 저하를 겪는 풀무원·롯데웰푸드의 사례는 구조적 한계, 비용 부담, 판가 인상 제한 등으로 대표된다"면서 "반면 수출 비중 확대에 성공한 삼양식품·오리온은 고마진 프리미엄 제품과 현지화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식품·음료 산업의 미래는 해외 시장에서 더 많은 답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K-푸드 글로컬라이징이 결국 기업 운명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임이 뚜렷하게 입증된 상반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