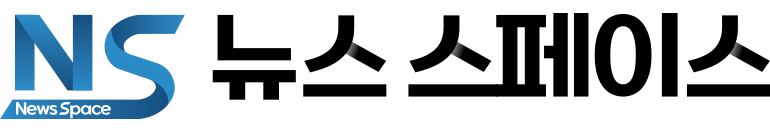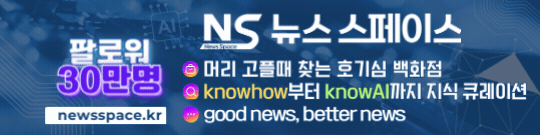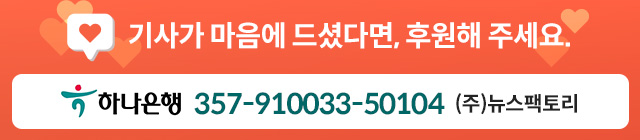공포영화를 딱히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는다.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사건>이나 <13일의 금요일> 같은 슬래셔 무비도 봤고, 잔인하지만 신선했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도 꽤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다. <파라노말 액티비티>는 과거 홍보까지 했던 작품이니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쏘우> 시리즈다. 현실 기반 공포를 바탕으로 스릴러를 깔고, 아무리 비현실적인 설정이라 해도 영화적 개연성을 놓치지 않으며 퍼즐 맞추는 쾌감을 주기 때문이다.
죽어도 다시 되돌아오거나, 하루가 반복되는 ‘루프 구조’ 영화는 이미 부지기수다. 그래도 넷플릭스 신작이 신선한 공포물일 것 같아 주말을 붙잡고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정말 처참했다.
◆ 반전도 약하고, 설명도 부족한 이야기
예측 가능한 범인, 예측 가능한 행동,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결말. 모래시계가 뒤집히면 등장인물들이 죽기 직전으로 돌아가는 설정 역시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해하는 척 보고는 있지만 불편하다. 원리도, 근거도, 환경도, 동기도 모두 허술하다.
아직도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가끔 성의 없이 제작된 한국영화에 실망하듯, 해외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절로 든다. 넷플릭스 신작에는 대체로 관대한 콘텐츠 헤비유저지만 이번만큼은 시간낭비를 한 기분이라 우울했다.
◆ 퍼펙트하진 않아도 ‘수긍’은 돼야 한다
이쯤에서 코칭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고객이 공감하지 못하는데 코치가 같은 방향으로만 밀어붙이면, 그 코칭은 실패로 돌아가기 쉽다.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걸 몰랐구나” 같은 수긍의 순간들이 이어져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설득에는 최소한의 개연성이 필요하고, 관계에는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다. 영화도 다르지 않다. 퍼펙트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관객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즘 따라 ‘대충대충은 안 된다’는 생각이 부쩍 든다. 반백을 앞두고 무엇을 하든 매사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를 이 화나는 영화를 보고 다시 확인한 셈이다. 이것이 그나마의 희망일까… (to be continued)
p.s. 그 악역은 <프리즌 브레이크>의 마이클 스코필드는 아니지만 그 악당 맞죠? 반가웠어요. 다만 나쁜 역할만 맡으시는건지 이미지가 굳은 것 같아요~ 문득 ‘언틸 던’이 뭐지 했는데 제목마저 실망입니다. 동틀때까지라니..맞죠?
* 칼럼니스트 ‘올림’은 건설,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식음료, 소재·화학, IT, 패션 등 다양한 업계를 거쳐온 홍보전문가입니다. 인증코치이기도 한 그는 ‘영원한 현역’을 꿈꾸는 미생입니다.